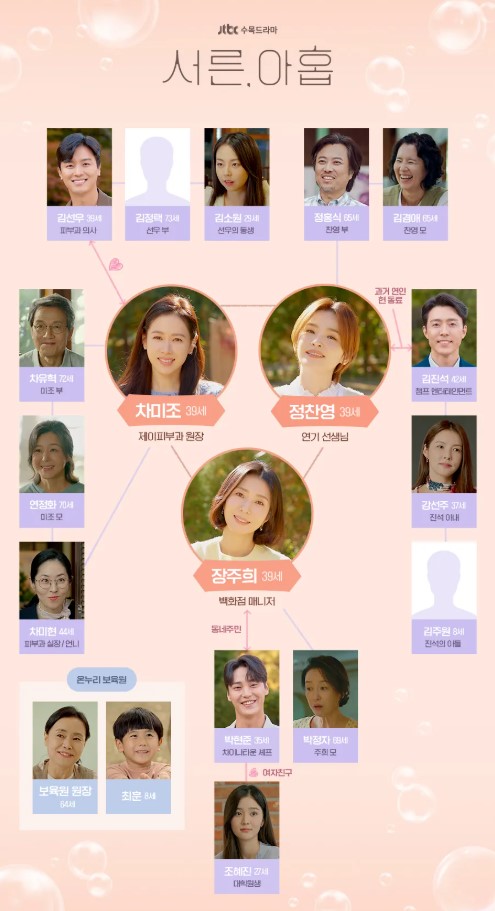
드라마 '서른아홉'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다. 이건 그냥 누가 죽고, 누가 울고, 누가 떠나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서른아홉이라는 나이, 그 애매한 교차로 위에 선 우리들의 이야기다. 서울이라는 도시,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도시에서 우리는 다들 무언가를 잃고 또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간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 이 드라마 안에 숨 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드라마 '서른아홉'이라는 도심 속 인생극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흘러내린 눈물
솔직히 말하자. 직장이라는 공간, 거기에는 인생이 없다. 그냥 생존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드라마 ‘서른아홉’은 거기에 아주 작고 조용한 생명을 불어넣는다. 인물들은 일하면서도 삶을 살아간다. 일과 일 사이에 숨죽여 울고, 차 안에서 혼자 분노하고, 회의실 앞에서 뭔가를 참아낸다. 아, 우리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내가 39이었을 때, 누가 갑자기 퇴사를 했다. 아침에 나란히 커피를 마시던 동료였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우리 모두 짐작했으니까. 버티다 버티다 무너진 거라는 걸. 그날따라 커피가 쓰게 느껴졌다. 드라마 속 차미조도 그랬다. 겉으론 의연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슬퍼도 바로 다음 회의가 있다는 거다. 울고 싶어도 안 되니까. 드라마 속 인물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장면,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건 그냥 연기가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연애는 언제나 어설픈 척, 그러나 아주 진짜 같아
‘서른아홉’을 보면서 연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30대 후반의 연애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지 않다. 이 나이에 사랑에 빠지는 건 종종 미안한 일이 된다. 상대에게,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드라마 속 연애는 가짜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 말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불안해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기다려줘’가 더 진하게 들리는 나이. 서른아홉의 연애는 그런 거였다. 어느 날, 드라마 속 선우와 미조가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장면이 나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장면에서 왜 그렇게 울컥했을까? 아마도 우리 삶이 그래, 특별한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은, 말보다는 침묵 속에 머무는 감정인지도 모른다.
도심이라는 배경 속, 잊혀지는 나를 붙잡는 이야기
서울이라는 도시는 잔인하다. 빠르고, 차갑고, 무관심하다. 나라는 존재는 이 도시에서 너무 작아서, 누군가의 인생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드라마 '서른아홉'은 그런 나에게 말을 건다. “네 삶도 충분히 영화 같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오래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라는 뻔한 말,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말은 언제나 특별하다. 서른아홉의 주인공들이 그랬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한다. 그런 게 인생이구나. 그런 게 사람 사이의 온도구나. 그리고 도심 속 그 어느 카페,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서 ‘나도 드라마의 일부였구나’ 생각하게 됐다. 버티고, 지치고, 웃고, 사랑하고, 또 버티고 있는 우리가 모두 도심 속 인생극장의 주인공이었다.
결론 : 요약
‘서른아홉’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잊고 살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보여주는 감정의 거울이다. 이 드라마는 서울이라는 복잡한 무대 위에서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삶도 누군가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버틴 당신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하고 싶다. 어쩌면, 당신의 잊고 있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까.